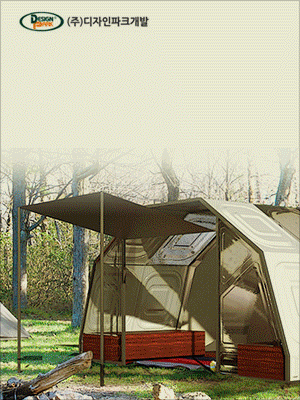[기자수첩]포이동 화재현장 할머니의 절규
-할머니의 한서린 이야기에 가슴이 매이고
기사입력 2011-07-05 20: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하미기자
본문
0
|
필자가 만난 74세의 박분점 할머니. 박 할머니는 이곳 판자촌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한다. 이곳에 와서 남편을 잃고, 폐지와 재활용품을 주우며 근근이 생활해왔다. 하지만 화재 당시 소방호스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이 부러져 지금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워낙 고령인데다 치료비 1500원이 없어 외상으로 병원에 다닐 정도. 하지만 박 할머니를 더 슬프게 하는 건 30년을 살아온 터전이 순식간에 불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손목이 부러진 사실도 당시에는 몰랐을 정도라고 한다.
불이 났을 당시 몸만 간신히 뛰쳐나왔다는 박 할머니는 인터뷰 내내 “손자들에게 가장 미안하다. 일찍 죽지 못한 내 탓이다. 빨리 죽고 싶다.”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줄 몰랐다. 이렇게 푸념할 때면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막내 손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과자를 사달라며 조른다고 한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몇 백 원짜리 과자도 사줄 수 없는 박 할머니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손자들 용돈이라도 쥐어주고자 했던 박 할머니의 소박한 꿈은 불에 탄 집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박 할머니는 현재 임시거처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다 큰 손자도 그 곳에서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 새우잠을 청한다고 한다. 박 할머니네 가족 6명은 이번 화재로 뿔뿔이 흩어졌다. 박 할머니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며 이곳에 여섯 식구가 다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했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 입맛은 없지만 손자들 용돈을 주기 위해선 잘 먹고 빨리 나아야 한다며 박 할머니는 다치지 않은 왼손으로 서툴게 숟가락을 들었다.